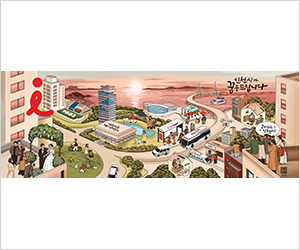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됐지만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비주력 사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경 인베스트 포럼’에서 “M&A 시장은 지난해까지 3년째 침체였지만 올해는 시장 주체들이 활로를 모색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을 매각해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M&A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PwC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바이오·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전 세계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3만 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투자 후 5년이 지나면서 매각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금리 시대에 사모대출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M&A 거래를 돕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민 대표는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장악한 산업을 넓은 의미의 인프라로 해석하면서 국내 기업이 효율을 늘리려 인프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대표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 변화를 ‘액티브(ACTIVE)’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미스(PROMISE)’ 전략을 제시했다. ACTIVE는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미중 경제·기술·국방 패권 경쟁(China-US) △기술 혁명(Technology AI) △중물가·중금리 고비용 구조(Inflation·금리) △지정학적 공급망 혼란(Value chain·재편) △넷제로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앞 글자를 땄다. 그는 “트럼프 2.0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 보호무역주의, 친환경 정책 후퇴가 핵심”이라며 “이는 AI·헬스케어·방위산업에는 호재이지만 자동차·친환경에너지·2차전지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소비재에서 식음료의 경우 해외 생산과 유통망, 화장품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접근을 위한 투자가 유용하다고 봤다.
헬스케어는 트럼프 정부가 생물보안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오히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신약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거나 CDMO 기업을 선제적으로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의 경우 대선 공약에 토큰증권(ST)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으며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 만큼 기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에 힘이 실리고 더 나아가 해외 금융사 인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제철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운영 최적화를 해답으로 제시했고, 산업재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판매 지역에 생산 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 대표는 2~3년 전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M&A를 했던 정보통신과 미디어 산업에서는 올해 타 업종 기업이 기술 확보를 위해 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나서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봤다. 민 대표는 현대자동차를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들면서 "단순 자동차 제조사에서 벗어나 동남아 그랩과의 파트너십 체결,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과의 로보택시 합작법인 설립, 미국 현지 도심항공교통(UAM) 슈퍼널 설립, 미국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사 위브그리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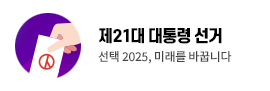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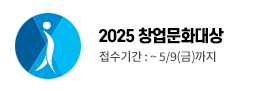








 good4u@sedaily.com
good4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