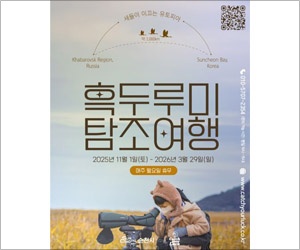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 합의 직후 세계 각국의 화웨이 인공지능(AI) 칩셋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국과 ‘모든 종류의 합의’는 가능하지만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 한해서는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정부는 AI 칩셋 수출을 놓고 전 세계에 대해 ‘등급’을 나눴던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개별 협상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AI 칩셋 수출을 지렛대로 삼아 자국의 요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3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성명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 어센드 칩셋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통제 위반”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 국가의 화웨이 AI 칩셋 구매를 사실상 막아서는 조치다.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90일간 관세 휴전을 선언한 직후 미 정부가 AI 칩셋 추가 규제를 선언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철강 등 전략 핵심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심각하게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산업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거대한 경제 재조정(re-balancing)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과의 ‘전반적인 디커플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략적 필수품들을 위한 디커플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AI 생태계 발전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따른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對)중국 AI 칩셋 수출 규제로 반사이익을 봤다. 엔비디아 등 미국산 고성능 AI 칩셋 구매가 끊긴 중국 테크 기업들이 화웨이로 눈을 돌린 덕이다. 또 중국 내수 시장 외에는 수요가 없는 만큼 매출 타격도 미미하다. 하지만 중국 AI 생태계를 내수 중심의 ‘외딴섬’으로 고립시켜 중국 밖으로의 확장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 상무부 발표에서는 ‘동맹국 AI 생태계의 미국화’ 전략이 읽힌다. 이날 발표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도입돼 15일 시행될 예정이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칩셋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면서 나왔다.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두고 “수십 개 국가를 2등급 지위로 격하시키면서 이들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OSTP) 겸 과학기술보좌관이 최근 열린 밀컨 콘퍼런스에서 언급한 “전 세계의 미국 AI 계층화”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리융 중국국제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헤게모니를 이용해 시장 운영에 간섭하고 다른 국가들이 대체 기술을 선택하는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기술 제한 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혁신을 추구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중국이 AI 칩의 더 발전된 독립적 개발로 나아가도록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해당 조치를 놓고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권이 기존 등급과 별개로 각국에 대한 개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권이 관련국들과 개별 협정을 진행하는 자체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 “일본과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정권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말해 미국이 협상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eherenow@sedaily.com
beheren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