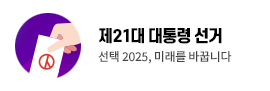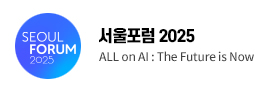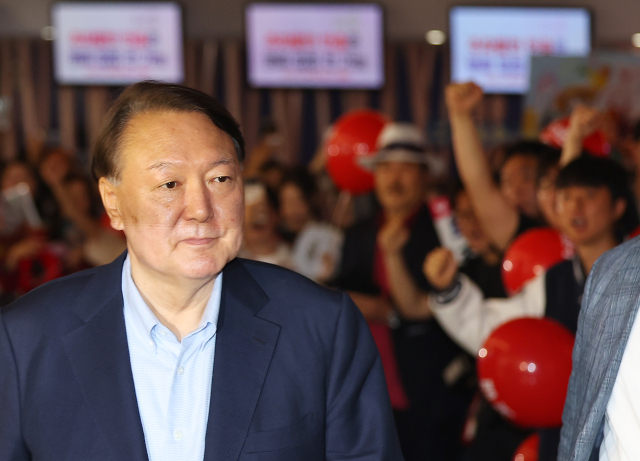"안녕,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1930년대 초와 193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피로감은 어떤 때에는 너무나 심해져 형용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되었소. 당시 나는 느꼈소. 우주가 사멸하든 말든 혁명하든 반혁명을 하든 간에 좀 쉬었으면, 쉬었으면, 쉬었으면!! 그렇소, 이제 ‘영원한 휴식’의 기회가 왔소.”
1935년 5월 22일 공산주의자 구추백(瞿秋白·취주바이)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다여적화(多餘的話·부질없는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중국공산당의 영수로 추앙받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20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구추백. 하지만 그가 1935년 국민당에 체포돼 사형되기 한 달 전에 남긴 최후 진술서 ‘다여적화’는 충격적인 자기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범한 일개 문인이 중국 공산당의 영수로 명성을 누린 것이야말로 “‘역사의 오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는 자조적인 어투와 함께.
필자는 정년을 앞둔 민두기(1932~2000) 선생님의 1997년 마지막 해 대학원 강의를 통해 구추백의 ‘다여적화’를 알게 됐다. 당시 강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구추백의 폐결핵이라는 상황도 고려해야…죽음 직전에 약한 모습 있기에… 아마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듯….”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00년 5월 민 선생님은 갑자기 소천하셨다. 사후에 백혈병으로 몇 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추백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라 놀라고 마음이 오랫동안 아팠다. 그리고 다시 ‘다여적화’를 펴 보니 “나는 이제 마지막 남은 가면을 벗는다. 그대들은 나를 축하해 줘야 하오. 나는 이제 쉬러 가니. 영원히 쉬러 가니 그대들은 더더욱 나를 축하해 줘야 하오”라는 구추백의 고백이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 당시 선생님께서 이미 성큼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미리 감지하시고 ‘곤학(困學)’이라 부르셨던 학문의 여정을 빨리 마무리하길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5월을 맞아 엄격이라는 가면을 쓰셨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떠오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