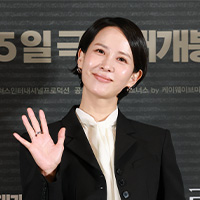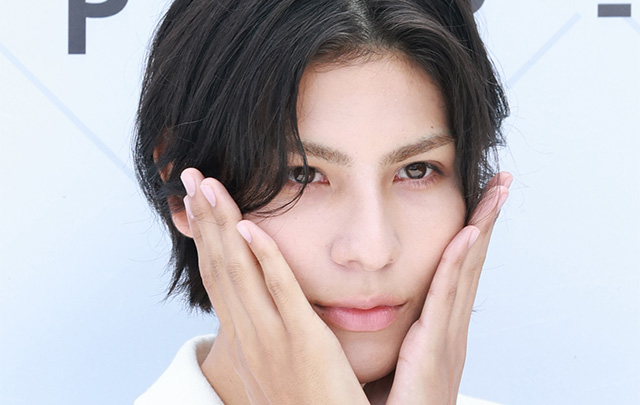올 상반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인당 평균 급여가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6000만 원)와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같은 대기업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데는 연봉과 처우가 최상위권인 은행이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명분으로 습관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주 4.5일제 시범 근무와 임금 5.2%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에도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달라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노사가 저학년 자녀의 출근 시간 조정을 비롯한 일부 근무 조건 개선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에도 사용자단체와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2일 “은행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금융노조 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파업 결의 같은 강도 높은 투쟁 수위를 보이다가 결국은 파업을 하지 않을 확률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와 여당이 주 4.5일제 도입에 적극적인 만큼 노조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다. 당장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주 4.5일제를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도 주4.5일제 확산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2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금융노조에서는 2002년 주5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경험이 있는 금융계가 주4.5일제 확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4.5일제가 시행되면 금융권이 추가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금융노조 측이 강조하는 근거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4.5일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계에서는 주4.5일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특히 은행권과 대기업은 주4.5일제를 어떤 식으로든 시행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경영 부담에 초기 도입이 어려워 노동자 간 격차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단순 업무의 경우 인공지능(AI) 대체나 비대면 영업 강화로 근로시간 단축을 메울 여지가 많다”며 “반면 주4.5일제는 기업금융과 같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