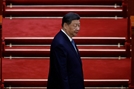16일(이하 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끝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맨유는 3대0 대승으로 3위 아스널을 승점 1점 차로 압박했다. 경기 결과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웨인 루니(맨유)의 골 세리머니였다. 루니는 전반 34분 수비수 4명 사이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린 뒤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전날 나온 영국 언론의 보도를 의식한 세리머니였다. 보도에 따르면 '복싱광' 루니는 올 초 자신의 집 주방에서 옛 동료 필 바슬리와 장난으로 주먹을 나누다 'KO'를 당해 잠시 의식을 잃었다. 이 때문에 '축구선수로서의 몸 관리보다 위험한 장난이 먼저냐'는 비난이 일자 의도된 골 세리머니로 대응한 것이다. 바슬리의 아내에 따르면 루니는 바슬리의 펀치를 맞고 잠깐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났을 뿐 기절한 일은 없다. 경기 후 루니는 "친구들과 집에서 벌인 장난이 전국에 발행되는 신문의 1면에 실리는 세상"이라며 씁쓸해했다.
이같이 선수들에게 골 세리머니는 자신을 변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악동' 마리오 발로텔리의 '왜 나만 갖고 그래(WHY ALWAYS ME?)'는 적극적 항변의 대표 격이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던 발로텔리는 지난 2011년 10월 맨유전에서 선제 골을 넣은 뒤 무표정한 얼굴로 유니폼 상의를 걷어 올렸다. 유니폼 속 셔츠에는 'WHY ALWAYS ME?'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극성스러운 영국 언론과 팬들을 향해 외치고 싶은 한마디였다. 발로텔리는 경기 전날 자택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다 불이 번져 소방차가 출동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안 그래도 악동으로 불리던 그는 이 일로 구설이 확산되자 말 대신 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발로텔리는 "집에 놀러 왔던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사뮈엘 에토오(당시 첼시)의 '노인 세리머니'도 반응이 뜨거웠다. 에토오는 토트넘전에서 득점하고는 한 손으로 코너 플래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만지며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 연기를 했다. 조제 무리뉴 첼시 감독이 비공식 석상에서 "첼시에는 쓸만한 공격수가 없다. 심지어 에토오는 서른둘인지 서른다섯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 데 대해 무언의 항의를 한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 선수들은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무리뉴는 이를 노골적으로 비꼬는 바람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데이비드 마일러(헐시티)는 지난해 선덜랜드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에서 코너 플래그를 머리로 들이받는 '박치기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앞서 뉴캐슬전에서 상대 감독인 앨런 파듀와 신경전 끝에 박치기를 당한 뒤의 일이었다. 파듀 감독은 7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1억원을 물어야 했다. '골프스윙 세리머니'도 있었다. 주인공은 발로텔리 못지않았던 악동 크레이그 벨라미. 2007년 리버풀 팀 동료 욘 아르네 리세의 방을 급습, 골프채로 폭행하려 했다는 보도에 휘말렸다. 하지만 벨라미는 곧이어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에서 리세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인 끝에 동점 골을 넣고 리세의 역전 결승 골까지 도왔다. 동점 골 뒤 벨라미는 호쾌한 빈 스윙으로 언론 보도를 비웃었다.
상의를 벗어 웃통을 드러내는 골 세리머니는 요즘은 일반적이지만 2000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애스턴 빌라 소속이던 다비드 지놀라는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상의를 벗고 포효했다. "피트니스 중독"이라는 감독의 지적이 잘못됐음을 마른 몸을 보여주며 증명한 것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