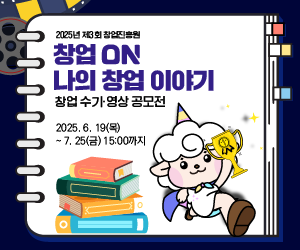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격락손해’(隔落損害)로 일컬으면서,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고, 사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 차량의 감정금액이 100% 인정됐다. 이들의 차령(차량등록 이후 기간)은 1년부터 3년 10개월까지 다양했고, 이들 중 4명은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차령 1년인 중형SUV 차량 소유주 오모씨는 수리이력이 1회 있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차령 4년9개월(주행거리 1만2,000㎞)인 SUV차량 소유주 임모씨는 수리이력이 2차례 있고 사고에 본인 과실이 10% 있음에도 감정금액의 80% 수준인 22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았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차령 6년에 주행거리가 11만㎞에 달한 경우와 차령 3년9개월에 주행거리가 7만㎞이고 수리이력이 5차례인 경우는 손해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격락손해 소송은 최근 크게 느는 추세다. 법원이 그동안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종종 내린데다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처럼 수십명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지 않으면 소가가 소액이어서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을 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아직 많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격락손해금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