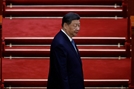|
현직 대사가 특허청장으로 부임해와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필자가 초임 사무관 시절 특허청에서 7년간 근무했고 디자인 심사도 해봤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게 언제 적인데 경력이라고 내세우느냐'며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허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 외교관이 된 게 신기한 것이지, 현직 대사가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것은 별로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사가 지식재산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활용해본 통상 분야에서 주로 일한 사람이라면 외교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여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모두 조금씩은 아는 덕목이 필수다. 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사를 국가를 대리해 전달해야 하므로 어느 한 분야라도 까막눈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외교에 더해 특별한 분야에서 전문성까지 있다면 좋겠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칫 전공 분야에만 관심을 두다가는 상대방이 관심 없는 것만 자꾸 언급하거나 비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눈만 껌벅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사의 덕목은 특허청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지재권에 대한 어느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지재권 전반에 걸쳐 조금씩은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대사와 청장의 공통 분야도 있다. 지재권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넘어 처음부터 내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발명가·창작가에게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제도 자체가 국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은 특허제도의 국제화 추세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난 5월 부임 후 첫 국제회의였던 선진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 다녀왔다. 한국이 이미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글로벌 지재권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던 자리였다. 주요국 청장과의 대화에서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과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지재권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상 분야에 적용한 경험을 앞으로 잘 살리고자 노력하겠다.
외교는 결정된 국가의사를 외교적 형식과 정중함으로 포장해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다. 외교관이 '전달' 역할을 잘하면 전쟁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특허청장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지재권 법제와 정책을 국민·발명가·언론, 관련 업계, 국회·사법부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특허청 고객의 머리를 끄덕이게 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길이다. 이렇듯 전달자로서의 대사와 직접 법제나 정책수립을 담당하는 특허청장의 역할은 큰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사와 청장은 낯설면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