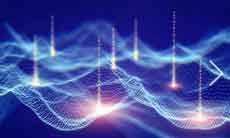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야후 인수전에 뛰어든 데 이어 애플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집중하는 버핏의 투자철학이 바뀌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의 ‘버핏 따라하기’ 전략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핏은 야후 인수에 흥미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애플 투자도 그의 후계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핏이 기존의 ‘가치투자’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해서웨이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애플 주식 981만주, 10억7,000만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버핏이 정보기술(IT)주 투자를 꺼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버핏은 2012년에도 “기업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도 모르는 구글·애플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애플은 아이폰 판매부진 등으로 매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올 1ㆍ4분기 실적발표 이후 주가가 13%나 급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아이컨엔터프라이즈 회장인 칼 아이컨은 지난달 28일 애플 지분 전량을 팔았으며 데이비드 테퍼 아팔루사매니지먼트 설립자도 올 1ㆍ4분기 애플 지분을 매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버핏이 애플이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변모하는 시점에 주목했다고 보고 있다. 시노부스트러스트의 다이널 모건 매니저는 “애플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인텔·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IT 기업”이라며 “구글·아마존·넷플릭스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람파트너스의 제프 매튜스 대표도 “애플은 IT 기업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업”이라며 “훌륭한 사업 모델, 풍부한 현금에다 주식도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매출과 순이익, 시장지배적 지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등이 버핏의 투자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애플 투자를 주도한 것은 버핏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버크셔해서웨이 투자책임자인 토드 콤스와 테드 웨실러로 확인됐다. 버핏은 WSJ에 보낸 e메일에서 “애플 투자는 나와 상의하지 않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WSJ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큰 투자는 버핏이 결정하는 반면 콤스와 웨실리의 총 운영자산은 각각 90억달러로 평소 수억달러의 투자를 담당한다”며 “버핏은 IT를 포함한 이들의 투자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 규모는 1,290억달러에 이른다.
버핏이 모기지 업체인 퀴큰론스의 댄 길버트 회장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야후 인터넷사업 부문 2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전형적인 IT 기업 인수와는 거리가 멀다. 버핏은 이날 CNBC에 출연해 “야후는 과거 내가 투자했던 유형이 아니고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오랜 친구인) 댄이 적당한 조건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적투자자로서 이자와 배당수익을 얻기 위해 돈은 빌려주겠지만 야후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ihuk@sedaily.com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