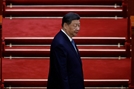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교·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 복원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잖아도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아 사회·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경제·안보는 물론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이 미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김 전 대통령의 대일 외교전략은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10월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방문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만나 양국관계의 다양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은 이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의 끈을 보다 공고히 한 토대로 평가받고 있다. 2001년 7월 일본과 맺은 2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는 국익을 우선한 실용외교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늘어난 한일 통화 스와프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만기연장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종료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긴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청구권협정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국익과 먼 미래를 내다본 실용외교 전략에서였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여야 했다”고 언급했다. 정치적 이해만 따지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던 그의 외교정책은 한미 간에 불필요한 여러 마찰도 피하게 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주에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예고돼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마감 시한이 24일이고 우리 군의 대규모 독도방어훈련도 예정돼 있다. 이 사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가 또다시 분수령을 맞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대화의 불씨를 살린 만큼 감정보다는 냉철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진정한 극일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