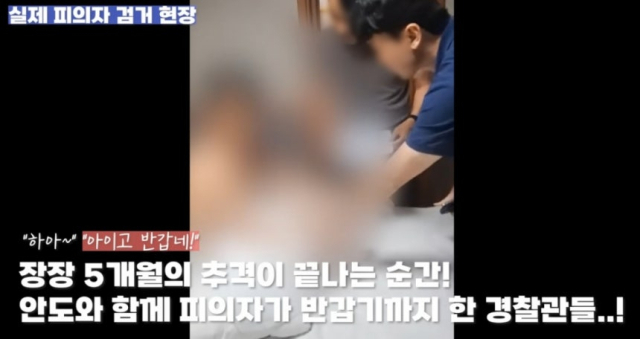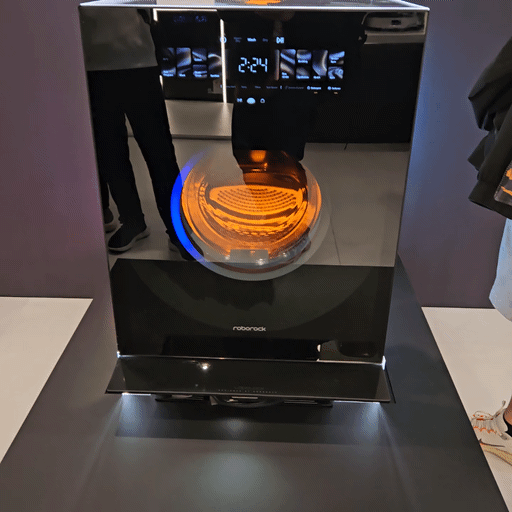미국과 중국 정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인권·민주주의, 무역 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2시간에 걸친 통화에서 홍콩 탄압과 신장의 인권 유린, 대만 문제 등 중국 측에 민감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바이든 시대에 미중 패권 전쟁이 더욱 가열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에 시동을 건 셈이다.
두 강대국의 정면충돌로 우리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다. 이런 측면에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9일 “북한의 도발 행위보다 동맹국과의 불협화음이 더 우려된다”고 강조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는 “북한이든 국제적 도전이든 먼저 미국과 동맹이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린다면 한미 간 균열만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의지가 분명해지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살피는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대북 평화 타령에서 벗어나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속히 매듭지어 동맹의 불협화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도 정착시킬 수 있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