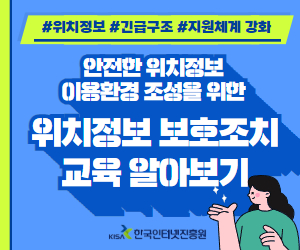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기업을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정말 무겁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회사가 어려우면 살 길을 개척하는 등 모든 책임이 CEO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직원을 탓하는 순간 그 기업은 가망이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지방 이전 기업 중 우수 사례로 꼽히는 게임 업체 마상소프트의 강삼석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CEO는 ‘잘되든, 못되든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표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곳도 금융회사였다. 그가 게임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게임 회사인 마상소프트를 창업했다.
2013년에는 회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다.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시에서도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기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애에 봉착했다.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직원들이 거의 다 회사를 떠난 것이다. 강 대표는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는 최소 70%는 같이 가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1명 중 부사장과 팀장 2명 빼고 모두 퇴사하더라”며 “진행하던 프로젝트마저 그만둘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수십억 원이 더 들어야 하는 형편. 그나마도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경영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당시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질 때였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온라인을 버리고 모바일로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IP)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는 “게임을 개발할 여력이 안 된다면 다른 IP를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라는 판단이 섰다”며 “때마침 PC 게임사들이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IP를 내다 팔기 시작해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그렇게 끌어모은 IP가 10개나 됐다”고 설명했다.
IP는 얼마 안 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됐다.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까지 수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06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0억 원, 7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프리스톤테일M’과 같이 이 회사가 보유한 게임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등장하면서 로열티 수입이 급증한 덕이다. 강 대표는 “우리에게 게임 IP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얼마 전 중국 게임 업체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IP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CEO의 중요성이다. 만약 부산 이전 당시 직원들이 떠났다고 포기했다면, 또는 남들처럼 시류에 따라 모바일 게임 개발에 뛰어들었다면 지금의 마상소프트는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회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를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일반 직원이 아닌 CEO입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든 책임은 CEO가 져야 할 몫입니다.”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상소프트 직원 수는 100여 명 정도.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자체 모바일 게임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더 많은 개발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쓸만한 인재는 대부분 서울로 떠나고 지방에는 남아 있지 않은 탓이다.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만들어 인력을 보강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 대표는 “지방에서 게임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절망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방 이전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