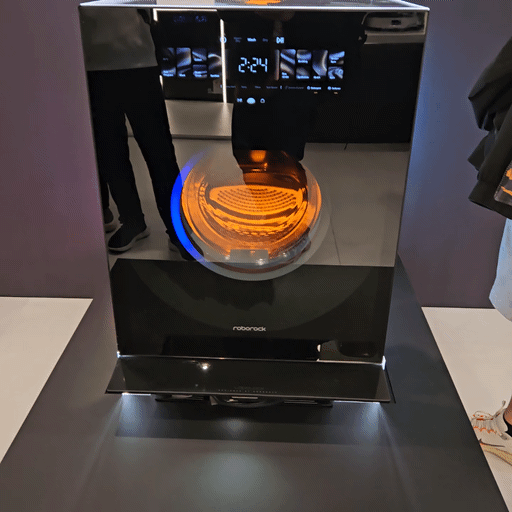파업에 찬성하는 많은 의사들은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토로한다. 가까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루 16~17시간의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업무 환경은 누가 봐도 개선이 필요하다. 진료비 수가체계를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진료비 수가는 ‘30분 대기 3분 진료’를 낳는 근본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협의 이번 토요 진료거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정부가 일명 진료비 정액제로 불리는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에 전면 적용하자 강하게 반발한 의협은 수술거부를 선언했다. 제도의 강제적용을 유보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나 백내장 수술 등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행히 당시의 사태는 바로 직전 정치권 등 외부세력이 개입하며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의협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 진료거부를 너무도 쉽게 입에 올리는 모습에 놀라울 정도다.
의사 파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들이 겪는 불편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몸이 아픈 정도는 누구도 조절할 수가 없다. 사소한 징후가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의협은 국민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부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방식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박은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쓸데없는 자존심 문제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 간 대화창구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믿고 의지하는 의사선생님이 툭하면 진료거부를 입에 담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