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부터 벤처까지 ‘중소기업’이라는 명칭 안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기업집단들이 섞여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이란 소상공인, 전통 중소기업, 벤처기업 각각에 맞춤형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이 없어요. 그저 노동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만 있었을 뿐입니다.”
3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문겸(61·사진)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은 정부의 온정주의보다는 기업의 역량을 더 중시하는 경제학자였다. 그는 지난 1991년부터 숭실대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을 지낸 중소기업 정책 분야 전문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이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한 중소기업 정책을 채점하라 한다면 나는 C학점을 매길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가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전통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나눠 맞춤형 접근을 하는 대신 노동정책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들 각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비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당장 생존을 위협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꼭 가야 하는 방향이라면 중소기업의 체급을 나눠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또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 확대를 위한 현금보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금보조가 강화되면 당사자들이 일은 안 하고 현금만 받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에 붙잡힌 결과 능동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은 실종되고 가장 ‘하수’인 현금보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뜻이다. 김 원장은 현금보조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소득에 비례해 환급액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저소득자의 능동적인 빈곤 탈출을 지원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또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의 하나로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꼽았다. 그는 “시장과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자영업자는 너무 많다는 게 소상공인 문제의 핵심이다. 창업 5년 만에 망하는 기업이 60%”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영업 창업 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매몰되는 대신 중견·강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추진해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지지부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네거티브 규제와 스케일업은 김 원장의 중소기업 정책 구상의 또 다른 축이다.
그러나 그는 관료집단의 저항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되는 것’만 열거한 포지티브 규제 체제보다 더 실험적인 사업이 가능한 구조다. 김 원장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방식이 더 부담될 것”이라며 “그나마 적용범위가 한정된 규제 샌드박스라도 먼저 도입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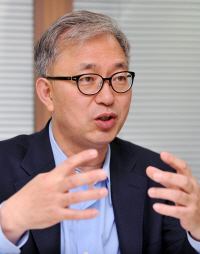
 vita@sedaily.com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