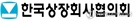저기 저 공사장 모랫더미에
삽 한 자루가
푹,
꽂혀 있다 제삿밥 위에 꽂아 놓은 숟가락처럼 푹,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느라 지친
귀신처럼 늙은 인부가 그 앞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무도 저 저승밥 앞에 절할 사람 없고
아무도 저 시멘트라는 독한 양념 비벼 대신 먹어줄 사람 없다
모래밥도 먹어야 할 사람이 먹는다
모래밥도 먹어본 사람만이 먹는다
늙은 인부 홀로 저 모래밥 다 비벼 먹고 저승길 간다
모래성은 허망하게 스러지는 것에 대한 오래된 은유지만, 놀랍도록 견고한 현대 문명의 바탕이 모래라면 얼핏 이해하겠는가. 우리는 모래가 주재료인 콘크리트 건물에, 모래로 만든 유리창에, 모래로 만든 도로에, 모래로 만든 안경을 끼고, 모래로 만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 빈스 베이저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20세기 산업사회와 21세기 디지털 세계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모래를 비벼 문명을 세우는 인부가 모래밥을 먹는다. 삽과 숟가락은 닮았다, 무덤과 고봉밥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견고한 것일까 <시인 반칠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