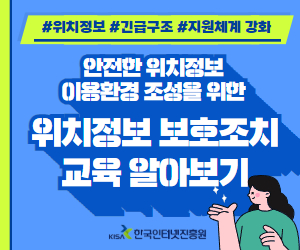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파사이사금 22년(101년) 봄 2월에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월성이라 지었고, 그 해 7월에 왕이 월성으로 옮겨 살았다.”
신라 왕궁에 대한 역사서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 기록이 ‘사실(Fact)’이 아니라면?
그렇다. 흔히 ‘천년 신라’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신라는 4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성립했으며, 월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실제 축조 연대가 너무 앞당겨져 있다는 것이 문헌학계의 정설이다.
신라 왕궁 ‘월성’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고고학과 문헌 전문가, 고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복합 조사 연구단을 꾸려 2014년 12월 학술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방어·배수를 위해 물길을 흘려보냈던 해자, 대형 교각인 월정교에 인접한 성벽, 왕궁 내부 건물지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990년대부터 꾸준히 이뤄진 해자에 대한 조사는 왕궁의 외부 경관에 대한 실마리가 됐다. 삼국시대 해자는 하천 범람이 잦고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형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백제 왕궁의 해자보다 2~3배 넓게 조성됐고, 높이 1.2~1.5m에 달하는 판자벽으로 보수·정비하기도 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해자를 조경 시설인 석축 원지(인공 연못)로 개축했다. 쉽게 비유하자면 관광 명소로 유명한 안압지 같은 유적이 7개 정도 만들어져 왕궁 경치를 치장했다고 볼 수 있다.
성벽은 월성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조물이다. 월정교 인근 서성벽과 남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기록보다 250년 정도 늦게 성이 축조된 것이 확인됐다. 서성벽에서는 성벽을 본격적으로 쌓아 올리기 이전에 행해진 인신공희, 즉 순장 인골 2구가 국내 최초 사례로 보고되면서 2017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도 경주 월성에서는 천년을 거슬러 신라인이 남긴 600여 년간의 왕궁 흔적을 흙 속에서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안에 석축 해자의 복원 정비가 마무리되면 신라 왕궁 ‘월성’을 방문해 역사 도시 경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기명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csi@sedaily.com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