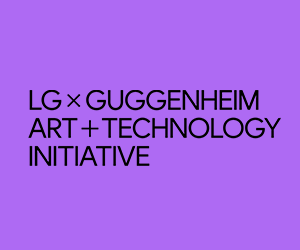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장기 투자 문화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 장기 투자 상품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ETF조차 평균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할 정도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투자 문화 탓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과도하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레버리지 등 단기 매매만 집중할 뿐 성과가 보장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외면하면서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의 데이터센터 분석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일반 계좌를 통해 보유한 ‘KODEX S&P500 ETF’와 ‘KODEX 나스닥100 ETF’의 평균 보유 기간은 각각 320일, 338일로 집계됐다. 유행을 좇는 테마형 ETF와 구분해 최소 수년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인식과 달리 두 상품 모두 1년도 보유하지 않는 셈이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를 꼽는다. 두 지수 모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 성장에 베팅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두 지수 모두 1980년대 이후 장기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가치투자의 대가’인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저비용 S&P500지수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장기 투자에 필수인 상품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2020~2024년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은 각각 14.71% 21.80%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상승률 3.45%, 4.22%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성과가 월등한 S&P500·나스닥 등 미국 대표 지수도 1년 이상 장기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레버리지·인버스 등 단기 투자에 몰두하는 건 세제 등 각종 정책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우호적이어서다. 정부는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도 0.18%에서 0.15%로 낮췄다. 증권거래세가 낮아질수록 거래량이 늘고 단기 매매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금융소득 최고 세율도 49.5%로 미국(37%)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누적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매년 2000만 원씩 3년 동안 6000만 원 소득을 실현하면 세금이 924만 원에 불과하지만 3년 동안 장기 보유한 후 한 번에 소득 6000만 원을 실현하면 세금이 228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장기 투자 혜택을 강조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 등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고서는 장기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장기 투자로 성과를 낼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대차증권 분석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3.3㎡당 평균 매매 가격 기준)의 10년 수익률은 157.8%로 코스피지수(25.3%)를 크게 앞지른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0~30대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심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S&P500 등 미국 지수형 ETF에 대한 장기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하루 평균 원·달러 환율의 변동 폭은 25.26원으로 올해 3월(9.79원)과 4월(14.85원)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미국 관세정책과 한미 환율 협상 등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환율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자 해외 투자도 신중해졌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S&P500지수가 아무리 장기 우상향하더라도 달러 가치 하락이나 원화 가치 강세로 환율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