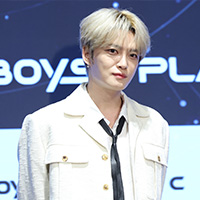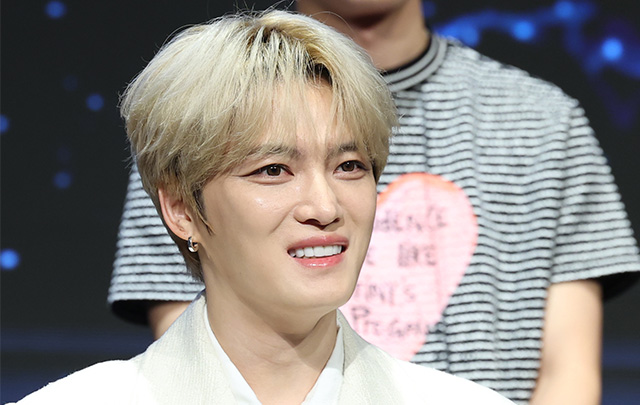도요타, GM, 혼다 같은 자동차회사들은 곧 연료전지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새로운 수소차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By Kurt Wagner
‘수소는 미래 에너지다. 앞으로 항상 그럴 것이다.’ 기술자들끼리 하는 오래된 우스갯소리다.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꿈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GM은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지녔지만 실용성은 거의 없는 연료전지차 쉐보레 일렉트로밴 Chevrolet Electrovan을 출시했다(가솔린을 전기로 변환하는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가 차 뒤쪽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최근 수소연료전지 는 더 작고 저렴해졌으며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했지만, 관련 기술들이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 내비건트 리서치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연료전지차는 채 500대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말 그대로 어쩌면) 수소의 시대가 마침내 눈 앞에 온 것 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거의 모든 자동차업체들이 수년 내로 수소연료차 모델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BMW와 함께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해 온 도요타는 11월 도쿄 오토쇼에서 새로운 연료전지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모델명이 아직 미정인 이 자동차는 201 5년 시판될 예정이며, 테슬라 에스 Tesla S(7만 달러를 호가한다)보다 저렴할 것이라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투싼 크로스오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소차 1,000대의 리스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르노와 닛산은 다임러, 포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2017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연료전지차의 개발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는 GM과 혼다가 2020년까지 수소차를 생산하는 합작 기술 벤처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혼다는 캘리포니아 주에 리스로 제공하던 연료전지차 클래러티 Clarity의 새 모델을 2015년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자동차회사들이 이렇 듯 일제히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료전지 비관론자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한 대기오염 규정에 맞추기 위한 업체들의 몸부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요 자동차회사는 2025년까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신규 판매량 중 22%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럭스 연구소(Lux Research)의 케빈 시 Kevin See 선임 애널리스트는 “전기차가 기대만큼의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자 자동차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에 맞출 대책을 찾아 수소차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료전지 옹호론자들은 나름 합당한 이유를 앞세워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제 수소가 환경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용 가능한 연료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수소연료전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주행거리와 안정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수년 간의 연구 끝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들은 이제 수소탱크 하나로 400km정도를 가볍게 주행할 수 있다.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을 불 식시키기에 충분한 경제성이다(3분이면 수소차 한 대의 연료탱크를 채울 수 있다). 현재 수소는 휘발유보다 갤런당 2~3배 비싸다. 하지만 연료전지 엔진이 휘발유 엔진에 비해 2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소연료가 아주 조금 더 비싼 셈이다. 미 에너지부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수소가격이 휘발유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연료전지차의 환경친화적 특징은 항상 큰 강점이었다. 연료전지는 수소에서 전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류를 만들어 환경오염 없이 조용하게 전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 수증기를 제외하면 배기가스가 거의 없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수소연료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휘발유차에 비해 보통 30~50%가량 적다(수소연료차 자체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소 생산 방식은 수소를 천연가스로부터 추출해내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에너지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기가스는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연료전지차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바로 인프라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내 수소충전소의 수가 너무 적다. 도요타 모터 세일즈 USA의 전략기획 담당 부사장인 크리스 호스테터 Chris Hostetter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기업가들은 충분한 수의 수소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까지 투자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회사들은 충전소가 많아질 때까지 충분한 수의 자동차를 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망(California Hydrogen Highway Network)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2010년까지 수소충전소 250개소와 수소차 2만 대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파트너십(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에 따르면, ‘거버네이터 Governator’ *역주: 주지사와 터미네이터의 합성어가 세운 목표시점을 3년이나 넘겼음에도 캘리포니아의 공공 수소충전소는 9개뿐이다. 19개 충전소는 아직 계획 중이며, 운행 중인 수소차는 수백 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 내 휘 발유차는 2억 5,000만 대에 달한다. 주유소도 17만 개나 된다. 수소충전소 하나를 짓는 데는 300만 달러의 막대한 돈이 든다. 모든 주유소를 수소충전소로 대체하려면 대충 계산해도 5,120억 달러가 필요하다(스웨덴의 GDP와 맞먹는 규모다). 업계에선 점진적인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파트너십의 대변인 키스 멀론 Keith Malone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2,000만 달러를 지원해 기업의 충전소 건설 투자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멀론은 “수소차 구입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년 동안 주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민간 기업이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a critical mass)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 지원금은 20개 충전소를 건설하기에 충분할 정도 다. 그러나 지금도 2,000억 달러의 지원금이 다 사용될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환경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주가 앞장서야 할 것처럼 보인다. 미에너지부는 지난 10년간 연료전지와 수소 연구개발에 15억 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에어 프로덕트 앤드 케미컬 Air Products & Chemicals이나 린데 Linde 같은 주요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가 미국에 더 많은 충전소를 세우는 데 그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또 하나의 녹색기술 분야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미국 태양에너지 관련 생산업체들은 급격히 쇠락한 바 있다). 독일은 50개, 일본은 100개의 새 수소충전소를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내에서 수소가 더 이상 ‘미래의 에너지’로만 고착되지 않으려면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론상 하락하는 비용
이제까지 차량용 수소연료전지는 대규모로 생산된 적이 없다. 막대한 생산비용도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는 연료전지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