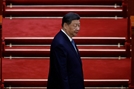|
|
미국증시가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털 장세로 바뀌고 있다. S&P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주가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기업이익 지표는 12개월 예상 주당순이익(EPS)이다. 미국 달러 강세와 그리스 위기가 지속됐지만 지난 3월부터 이 지표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기업이익 개선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 둘째,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해 살펴 보자. 미국 연준 금리선물에 내재된 확률 기준으로 보면,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연초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높아진 상태다. 다만 그 이후의 금리인상은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 않다.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국채 수익률에 내재된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이 주요 양적완화정책들이 발표됐던 수준도 밑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 지표는 △미국 달러 강세 기조 유지 △저유가 국면 지속 △미국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낮은 임금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강하게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연준이 고용 등 경기지표 개선으로 금리인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낮은 인플레 압력은 금리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해 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설비투자 및 주택경기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여전히 낮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아직 개인소비 개선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소비 회복에는 고용시장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효과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가계 자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주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가계의 디레버리징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비투자 및 주택경기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미국 연준이 통화완화 정책을 통해 당초 의도했던 '미국증시 상승→가계자산 증가→개인소비 증가→경기회복' 구도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연준은 금리인상 국면 초기에 미국증시 상승추세 유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회복이 더디다.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에 통화정책 결정 시 대외 경기여건도 고려하겠다는 문구가 신규로 추가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수출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외경기 회복마저 더딜 경우 수출경기 개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리스 사태 진정 이후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설이 부각됐던 작년 3·4분기에는 유로존의 경기지표들이 악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조정을 겪은 바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옐런 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는 금리인상 우려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미국증시의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 대해 살펴 보자. S&P 500의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예상 기업이익 개선 및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분기 및 2·4분기 기업실적 발표 시기를 거치면서 S&P500 상장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EPS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금융·산업재 업종의 순이익 마진 개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최근 미국증시가 역사적 고점경신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현상은 IT 버블기와 달리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