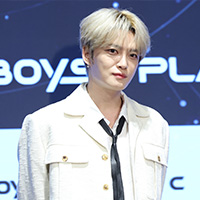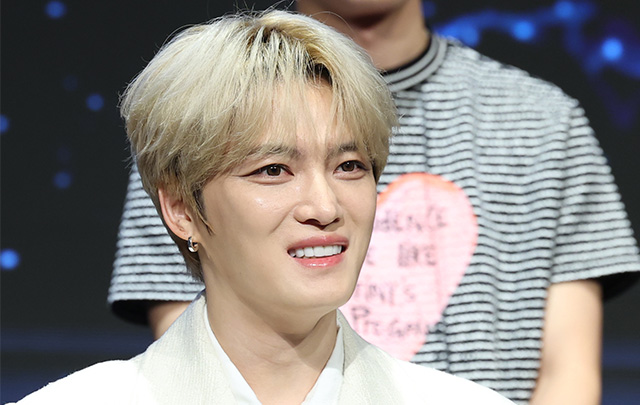헌법재판소는 5일 ‘절가된 가(家)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3명의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냈다.
호주인 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여성 호주가 된 후 이어 숨지거나 재가해 더 이상 호주가 될 상속인이 남아있지 않으면 절가가 된다. 1958년 민법 시행 전에는 이 경우 절가의 유산을 출가한 딸보다 말소된 호적부에 남아있던 다른 가족이 우선해 상속받도록 했다. 이는 민법상 상속 1순위인 딸보다 부모의 형제자매나 조카의 상속순위가 높다는 의미다.
헌재는 “민법 시행전 집안 재산은 이를 바탕으로 생활하고 제사를 모시면서 일가를 유지·승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며 “이에 재산을 분배할 때 출가한 여성이나 분가한 남성을 후순위로 한 것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집안 재산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출가한 사람이 재산관리나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현재도 민법에서 제사주재자에게 묘토인 농지나 족보의 우선상속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관습법은 민법 시행이전에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또 “민법 제정과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옛 관습법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넘어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소급해 효력을 모두 부인할 경우 이를 기초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이 관습법은 혼인으로 인해 남편 집안의 일원이 되는 출가녀와 혼인을 하더라도 여전이 동일한 가적에 남게되는 남성을 유산 승계에 있어 차별 취급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본안에 대한 판단 전 관습법이 심판 대상인지도 판단했다. 헌재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관습법 위헌심사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ok@sedaily.com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