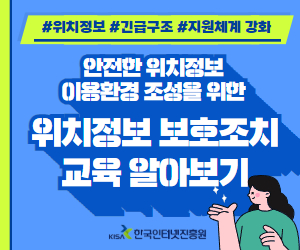올해 우리 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환경·사회·지배구조(거버넌스)를 의미하는 ESG 경영이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라기보다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열돔·대홍수·전염병은 돌이킬 수 없는 ‘뉴노멀’이 되었고 이것이 기업·사회·국가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 후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주주 자본주의를 끝내고 싶다”고 역설했다.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해온 유럽연합이 미국에 호응하면서 ESG 정신은 모든 국가와 기업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힘을 얻었다. 생태계 위기가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는 현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소비자와 투자자·근로자·지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가 절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자기 혁신을 게을리한 자본주의와 미래의 생태 환경을 미리 당겨 쓴 인류의 욕망이 빚은 예견된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ESG 표준은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불씨도 안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면화를 생산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을 중단한 바 있고, 나아가 ESG 표준에 미흡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융 펀드 제한·배제 형태로 규율할 태세다. 한편 중국도 국제 경제 질서의 규칙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맞대응하기보다는 ESG 추세에 적응하는 길을 택했다. 이미 중국형 ESG 표준을 만들었고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오랜 관행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환경(E) 영역에서는 개인별 전기 사용량의 알고리즘을 분석해 전기 절감 시스템을 만드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으며, 사회(S) 영역에서는 탈빈곤과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사회적 소외 지역에서 존재감을 찾고 있다. 지배구조(G)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여성 참여 등의 전통적 지표를 넘어 생물 다양성까지 치고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국제 감각에 밝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신을 꾀한다.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기업의 사회적 가치(CSV)를 통해 얻은 학습 경험을 ESG 경영에 본격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실질적 배출량 제로)을 선언하는 한편 600여 개에 달하는 방만한 지표를 정리한 한국형 ESG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낯선 길인 만큼 곳곳에 암초가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절박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도 ‘착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국형 ESG 지표도 환경과 사회보다는 거버넌스에 주목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무엇보다 단일민족에서 오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다양성 지표를 획기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여기에 손쉽게 ‘준조세’ ‘부담금’ 형태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는 우회로를 찾게 될 부작용의 위험도 있다.
그러나 강제노동방지법·탄소세법·탄소배출권거래제·탄소국경배출제와 같은 낯선 제도와 법률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를 줄이자는 ‘핏 포 55’ 입법 패키지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면서 후발 국가들에 고통스러운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우회하거나 역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느 대기업이 ‘새로운 오늘, 더 나은 내일(New Today, Better Tomorrow)’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오늘의 혁신 없이는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치는 ESG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정신을 또 하나의 규제로 보면 낙오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올라타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기업들은 계열사 CEO 평가에 ESG 지표를 활용할 참이다. 뜨거워진 정치판도 이러한 비전을 국가 경영의 화두로 놓고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