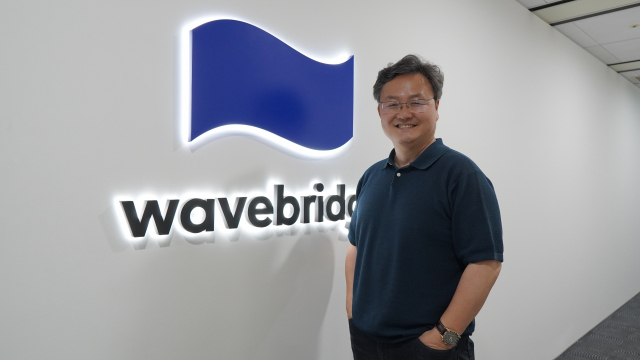“이즈 잇 유어 라스트 댄스(Is it your last dance·너의 마지막 춤이야)?” 지난 2월 14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하루 거래 마감을 알리는 ‘클로징 벨’ 세리머니를 마친 이태용(57·사진)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에게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업계의 오랜 지인이 물었다. 이 총괄은 “예스 앤드 노(Yes and no·그렇기도 아니기도)”라며 미소를 지었다. 이 총괄은 2006년에도 NYSE의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의 영광을 누렸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것. 일생에 단 한 번도 힘든 이벤트에 다시 찾은 그를 향한 질문에는 축하와 부러움, 질투가 고루 묻어있었다.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으로, 그리고 은퇴할 법한 나이에 다시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를 라이프점프가 만나 ‘마지막 춤’에 대해 들었다.
신혼 자금 들고 오른 유학길
미국 증시 거래가 시작되는 9시 30분과 장이 마감하는 오후 4시, 뉴욕 월스트리트 11번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NYSE의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이다. 신규 상장사가 뉴욕 증시에 데뷔할 경우 상장사의 임직원이 거래소에서 직접 벨을 울린다. 거래의 개폐장을 알리는 신호이자 글로벌 금융으로 걸음을 떼는 기념비적인 행사다.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을 울린 것을 시작으로 한국과 홍콩,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에서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을 울려봤죠.”
인생에 한 번 얻기도 귀한 경험을 줄줄이 나열하는 그의 원래 꿈은 상사맨이었다. 1970~1980년대 무역 호황의 시기. 그도 세계를 누비는 꿈을 꿨고, 1989년 무역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나 출장 가방을 들고 세계로 떠날 것만 같던 희망과 달리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한 외환 업무에 배치된다. 적성에 맞지 않아 삶의 전기(轉機)를 꿈꾸던 때 우연히 은행원들의 대화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 단어가 마음에 불을 댕겼다. 입사 2년 차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아껴둔 결혼 자금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다.
선진 금융시장을 배우다
언어와 공부, 빠듯한 살림까지 유학 생활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은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를 북돋웠다. 첫 수업에서 “조교를 할 사람”이라는 말에 머리보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용감했어요.”라며 조지워싱턴대학교 MBA 생활을 회상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데다 예의까지 바른 동양 청년은 교수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 교수는 미국 선물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 실(William Seale)이었고, 이 총괄의 지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94년 MBA를 마친 이 총괄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선물협회(NFA)에서 바로 일할 수 있었던 데도 실 교수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다. 이 총괄이 NFA에서 처음으로 맡은 업무는 감사였다. 그는 “미국 전역의 선물 트레이딩 회사들을 다니며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정식으로 선물거래소가 생긴 게 1999년인데, 그보다 한참 전부터 파생상품 전반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美 첫 레버리지·인버스 출시
5년간 NFA에서 내공을 쌓은 그는 메릴랜드주 베서스다에 있는 펀드 회사로 자리를 옮겨 ‘주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새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우리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ETF를 접목하라’는 주문을 받는다. 레버리지는 투자 성과를 가르는 기초 지수의 곱절로, 인버스는 기초지수의 반대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ETF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을 수소문해 배우며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갔다. 그렇게 수년을 매달린 끝에 2006년 미국 최초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 ‘프로쉐어즈(ProShares)’가 세상에 나온다. 그해 6월 그는 오프닝 벨을 울리는 영광을 안았다.
“요즘은 기계식 버저(Buzzer)를 사용하는데, 그때는 조그마한 망치를 줘요. 그걸로 종을 치는 거죠. 망치 막대기가 쇠였는데 굉장히 얇았어요. 머리는 무겁고. 그걸 막 휘둘러 종을 치려는데 긴장해서 땀이 나니까 손이 미끌미끌한 거예요. TV는 생중계하고 있고, ‘치다가 망치 날아가면 이게 기삿거리다’ 생각했죠. 처음엔 긴장 많이 했어요. 벨을 울린 한 건 한 건 저에겐 다 소중한 경험이죠.”
미래에셋 사장에서 스타트업 멘토로
그렇게 ETF를 상장시키고 2년간 포트폴리오 운용 책임자로 밤낮없이 일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탓일까.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몇 차례 쓰러지고 응급실로 가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었고, 숲으로 트레킹을 다니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2010년 이제 막 한국에도 ETF 시장이 커질 때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고 8년간 일하며 글로벌 ETF 헤드(사장)까지 지냈다.
국내에서 잠시 잊혀지는듯 했던 그는 2021년 새로운 직책으로 여의도에 컴백한다. 바로 핀테크 스타트업 ‘웨이브릿지’의 글로벌전략총괄이다. 흥미로운 점은 웨이브릿지를 창업한 오종욱 대표와 관계다. 이 총괄이 미래에셋에 있던 시절 오 대표는 직속 부하직원이자 애제자였다. 이제는 자리가 바뀌어 후배를 대표로 모시는 셈. 어색한 관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괄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업무 환경에 익숙하다”며 “젊은 직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도 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글로벌 ETF 선구자의 '라스트 댄스’
그의 은퇴 계획은 앞서 지인에 건넨 말대로 ‘예스 앤드 노’다. 당분간은 웨이브릿지의 성장에 주력하겠지만 5년 뒤, 10년 뒤 그가 어떤 신(新)시장에서 나타날 지 그도 모른다. 그저 흐르는 대로 자연스러운 인생 2막을 즐기겠다는 것만 분명하다. 이 총괄은 “나이로 은퇴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조정하며 구분하기보다는 가능한 대로 살 것”이라고 말했다.
단,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소망은 있다. “캐나다 국경쯤 캣스킬(Catskill)이라는 아주 예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나무집을 짓고 살아보고 싶어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