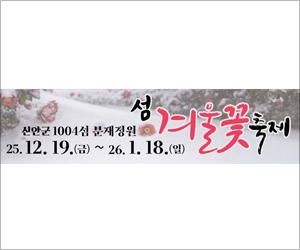은행들이 디지털 전환과 비용 효율화를 앞세워 점포 문을 닫는 사이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은 여전히 ‘현금을 찾기 위해 버스를 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금융 접근성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며, 디지털 포용이 아닌 ‘디지털 배제’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 시대 경영효율화와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의 과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점포 수는 2008년 4780개에서 지난해 말 3148개로 감소했다. 연평균 100개가량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점포 폐쇄는 주로 비수도권과 고령화 지역에 집중됐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점포 밀도는 낮아지고, 현금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점포를 디지털 채널이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대별 금융 접근 방식의 격차는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이 모바일로 예·적금을 이용하는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전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모바일 비중도 18.7%에 그쳤다. 반면 20대는 모바일 예·적금 이용률이 68.7%, 30대는 67.7%에 달했다. 전체 금융서비스에서도 20대는 74.0%, 30대는 79.5%가 모바일을 이용했다.
고령층은 여전히 ATM·실물카드·창구 방문 등 전통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적응력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접근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원 충남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 확산이 빈곤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고령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포용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금융 소외계층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보완책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대체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과 지역 인프라 수준을 반영한 정교한 사전영향평가, 금융회사별 접근성 공시 확대, 고령층 맞춤형 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shin@sedaily.com
sh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