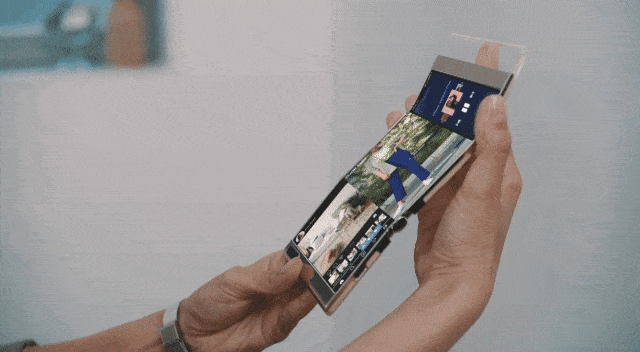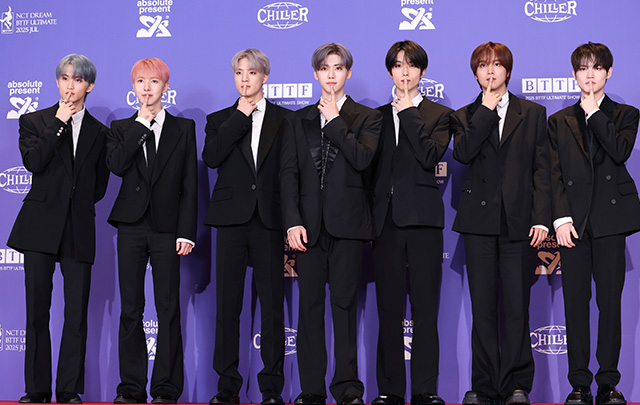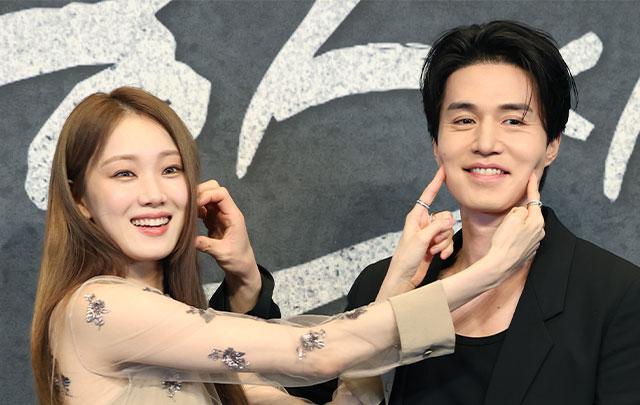시속 550km에 달하는 초전도 자기부상열차는 물론 바닷물에 자기장을 걸어 전류를 흘리면 바닷물이 뒤로 밀려나 스크루 없이 전진하는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
지난 2001년 2월. -234℃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액체헬륨으로 냉각할 필요 없는 새로운 초전도체 이붕소마그네슘(MgB)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 뒤를 이어 기체원자들도 초전도체의 전자들처럼 쌍을 이룬다는 것이 발견돼 세계 물리학계를 흥분시켰다.
이전까지의 초전도체 연구는 고체(금속)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체 원자에서도 초전도체와 유사한 초유동의 새로운 물질상태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금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상온 초전도체의 출현 가능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그것을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왜 과학자들은 초전도체에 열광하는 것일까.
자료제공: 한국산업기술재단
‘저항 제로’라는 큰 매력
초전도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카메를링 오네스다. 그는 1911년 절대온도 4K(-269℃)의 액체헬륨을 이용해 냉각된 물질의 전기저항 측정 실험을 진행하던 중 우연히 액체헬륨의 기화온도(4K)에서 수은 저항이 급격히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것이 초전도 현상이다.
특정 저온에서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 초전도체가 세상에 알려진 첫 순간이었다.
보통 휴대폰으로 오래 통화를 하다보면 손이 뜨거워지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이 있는 장소는 다른 곳보다 더 덥다. 이것은 가전제품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열은 전기에너지의 손실이다. 열에 의한 손실 없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물체가 바로 초전도체다.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에서 액체, 기체를 거쳐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는 플라스마로 변해간다. 반대로 온도를 절대온도 0K(-273℃) 가까이 냉각시키면 저항이 사라져 저항으로 인한 열 손실 없이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는 왜 전기저항이 제로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
오네스가 -269℃의 수은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지만 40년 이상 아무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채 물리학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 숙제는 1957년 미국의 물리학자 바딘(Bardeen), 쿠퍼(Cooper), 그리고 슈리퍼(Schrieffer)가 자신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붙인 ‘BCS이론’으로 풀어냈다.
보통 도체의 결정격자 구조는 불순물, 구조결함, 이온들의 진동으로 불완전한 형태를 띤다. 이 때문에 결정격자 속을 흐르는 전자는 곧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충돌을 반복한다.
충돌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결정격자에 빼앗겨 열이 되어 밖으로 달아난다. 이것이 저항이고, 전자들의 충돌로 인한 열로 도체 내에 저항 성분이 생긴다는 것이 당시 일반론이었다.
하지만 절대온도 0K(-273℃)의 초전도체에서는 모든 전자들이 둘씩 쌍을 이루어 서로 도우면서 결정격자 속을 진행, 충돌을 피한다. 마치 축구 선수들의 2대 1 패스 원리와 비슷하다.
자유전자 2개가 쌍을 이뤄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진의 저항을 뚫는다. 즉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이 전자쌍을 ‘쿠퍼쌍’이라고 하며, 초전도 현상을 양자역학적인 원리로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BCS이론이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BCS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전도체가 등장했다. 4K(-269℃)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들이 속속 등장한 것이다. 이른바 고온 초전도체다. 이붕소마그네슘도 그중 하나다.
초전도 물질 연구는 보물찾기
1987년 이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온도는 점점 올라가 현재는 -135℃에서도 가능해졌다. 점점 그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초전도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초전도성을 띠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초전도성을 보이는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초전도 현상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실온에서도 가능한지 역시 알 수 없다. 아직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수준인 셈이다. 초전도의 발견 이래 약 80년 동안 그 정체를 숨겨온 초전도의 명쾌한 규명이 금세기 내에 이루어질지 역시 불투명하다.
반도체와 달리 초전도 물질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아직까지 젖먹이 단계다. 하지만 초전도체에 대한 견고한 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지금 무엇을 연구하고 있을까?
분야에 따라 극저온에서 관찰되는 물리 현상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물리학 분야에서는 초전도라는 성질이 왜 절대온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화학 분야에서는 초전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어떻게 결합해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연구 중이다.
재료역학 분야에서는 어떤 원소끼리의 조합이 더욱 성능이 우수한 초전도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일렉트로닉스에 응용할 경우 어떠한 새로운 기능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극저온의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헬륨이다. 모든 기체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언젠가는 고체가 되는 데 비해 헬륨은 절대온도 0K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2.7K 이하에서는 초유체가 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초유체는 일반 액체와 달리 점성을 갖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유동 상태의 액체를 말한다. 또 다른 극저온의 연구 대상은 비자성(非磁性) 도체의 초전도 현상이다.
초전도 현상은 발견 당시부터 자성을 갖지 않으면서 도체인 비자성 도체가 극저온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비자성 도체에 속하는 물질 중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초전도 물질의 연구 탐색은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흡사하다.
초전도체가 가져올 미래상
그렇다면 사람들은 아직 문제 투성이인 초전도체에 왜 그토록 관심을 쏟는 것일까. 그것은 무궁무진한 응용성 때문이다.
초전도는 저온이나 고온이나 응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주로 전기저항이 없다는 특성을 이용해 에너지 손실 없이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특징과 높은 자장이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초전도체의 이용 방식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가볍다·얇다·짧다·작다’와 ‘무겁다·두껍다·길다·크다’는 재료에의 응용이다.
가볍고 얇은 방향은 전자공학 분야에 주로 응용된다. 초전도 물질의 표면이나 물질끼리의 경계인 계면의 영역을 원자 크기의 규모로 제어하거나 이 규모에서 평탄하게 가공하는 등의 초정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겁고 두꺼운 방향은 에너지 분야다. 이 분야에서는 온도, 습도, 압력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초전도체는 이미 실생활에서 만나고 있다. 병원에서 신체 내부를 촬영해 질병을 진단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가 초전도체를 이용한 장비다.
인체의 대부분은 물이다. 물은 원자로 구성돼 있는데, 원자 하나하나는 미세한 자기적 성질을 가진다. 실제로 MRI는 물 성분 중 수소가 가지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다.
초전도 전선에 강한 전류를 흘려 만든 강력한 전자석을 이용하면 인체 내 조직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물 분자의 자기적 성질과 그 농도를 측정해 영상으로 표현해 준다.
극저온 기술은 미인도 만든다. 얼굴의 모공이 넓어지면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화장도 잘 먹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196℃의 액체질소에서 나온 차가운 기체질소를 얼굴에 불어 모공을 좁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초전도체는 고유 저항 값이 매우 낯은 전선 제작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른 팔뚝만한 초전도 전선 한 줄만으로도 웬만한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소자에서도 초전도체가 사용될 전망이다. 지금의 반도체 칩을 초전도체로 대체하면 열을 냉각하는 장비가 필요 없어 크기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초전도체로 만든 전자석은 전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자석보다 수천 배 강한 자기력을 가진다. 이것은 초전도 자기부상열차를 가능케 한다.
바닥의 초전도 전자석이 레일에 깔려 있는 전자석을 밀어내기 때문에 열차는 공중에 떠서 시속 550km로 나아간다. 즉 밀어내는 힘에 의해 뜨고, 당기는 힘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초전도 특수 장치를 이용하면 하루 동안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바닷물에 자기장을 걸어 전류를 흘리면 바닷물이 뒤로 밀려나 스크루 없이 전진하는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
이렇듯 초전도체가 바꿀 미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실용적인 초전도체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무한도전을 향한 초전도와 인간과의 만남 또한 20세기에 비해 엄청나게 깊고 많아질 것이다.
글_김형자 과학 프리랜서, 칼럼리스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