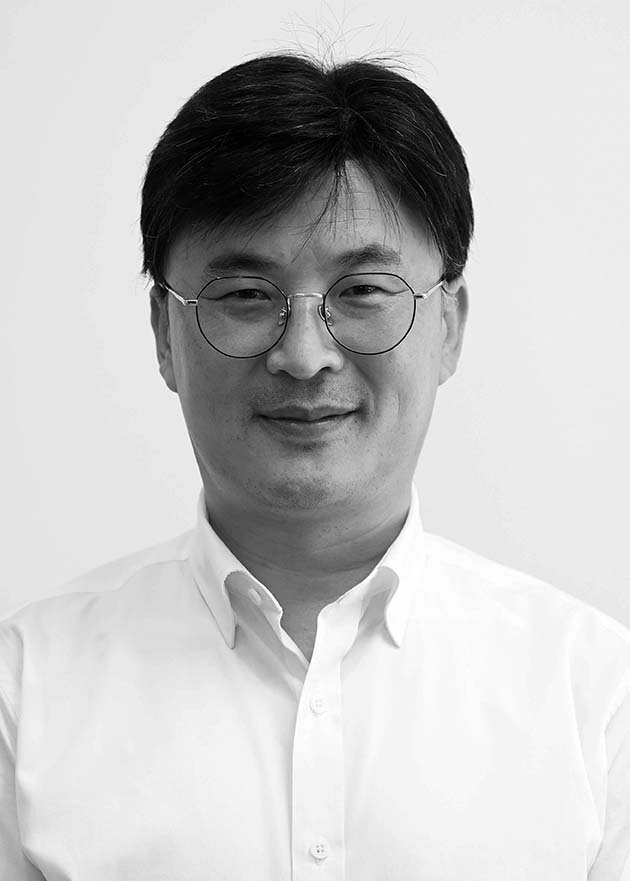금호산업의 인수합병(M&A) 담당자에게 대우건설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게다. 인수 성공 뒤 터트렸던 샴페인은 금세 김이 빠졌다. 재계 7위로 점프했지만 독이 든 성배였다.
OB맥주는 또 어떤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KKR과 어피니티는 2009년 2조 3000억 원에 샀던 OB맥주를 2014년 6조 2000억 원에 넘겼다. 5년 새 3조 9000억 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OB맥주 딜은 우리나라 M&A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OB맥주를 2조 3000억 원에 판 곳도, 그리고 6조 2000억 원에 다시 산 곳도 AB인베브였다는 점이다. 그 심정 역시 어땠을까.
기업에 M&A는 양날의 검이다.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헤어나기 힘든 깊은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재무 담당부터 전략·회계·법률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 진행하지만 잘 팔고 잘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 M&A는 대상 물색부터 가치 평가, 양해각서(MOU), 실사, 계약, 합병후통합(PMI), 사후 관리 등 대략 7단계를 거친다. 단계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정밀해야 해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M&A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를 정도다. 그런 M&A가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100조 원 안팎의 규모로 이뤄진다. M&A 프로젝트마다 얼마나 많은 사연과 역사가 있겠는가.
1997년 환란의 악몽 때문일 게다. M&A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냉소를 넘어 어둡다. 외환위기 뒤 수많은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팔아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론스타·외환은행 사태로 PEF가 주도하는 딜에는 ‘먹튀’의 수식어도 종종 붙는다. 현실을 보자. 국내 대형 딜은 MBK파트너스부터 한앤컴퍼니, 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PEF가 주도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국내 M&A 상위 거래 20건 중 PEF가 참여한 것은 80%나 된다. PEF에 자금을 공급하는 출자자는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PEF발(發) M&A를 향한 시선은 따뜻하지 않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딜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갑다. 기술 탈취부터 문어발식 확장, 탈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기업도 출자해 조성한 PEF의 성격이 블라인드인지, 프로젝트인지도 구분하지 않은 채 딜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특혜라는 등의 지적에 업계는 아연실색이다. 기업이 PEF와 결합한 딜을 두고서는 ‘비자금’이라는 주홍글씨도 달고 있다. ‘비밀 유지 협약’ 조항에 기업은 끙끙 속앓이를 할 뿐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 반격을 위해 비밀 유지 협약을 어겼다가는 잃는 게 더 많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M&A는 웬만해서는 수천 억, 수조 원 규모다. 자금 조달도 은행부터 증권사·연기금 등 여러 기관투자가들이 한다. 이중·삼중의 견제 장치를 둘 수밖에 없다.
2020년 딜을 끝냈던 매그나칩 인수 구조는 간단하다. M&A 목적의 프로젝트 펀드가 갖는 특징이다. 공동무한책임사원(GP)에는 크레디언·알케미스트파트너스가 참여했고 새마을금고와 SK하이닉스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합류했다. LP 두 곳이 4000억 원 이상을 조달해 딜을 마무리했다. 2018년 KCC·원익이 SJL파트너스와 글로벌 기업인 모멘티브를 인수한 것도 비슷하다. 딜의 규모는 30억 달러로 KCC·원익이 6억 달러, SJL이 6억 달러를 조달했고 남은 18억 달러는 금융사들이 해결했다. M&A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PEF 컨소시엄이 글로벌 기업을 인수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M&A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거나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부도 그래서 M&A 활성화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고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놓고 패권 다툼이 격화하면서 M&A에 대한 국가 간의 견제도 심해졌다. 기술을 놓고 벌인 기업 간 경쟁이 정부 간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대로 된 M&A가 국익이 된 시대, 이게 현실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