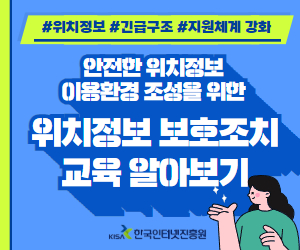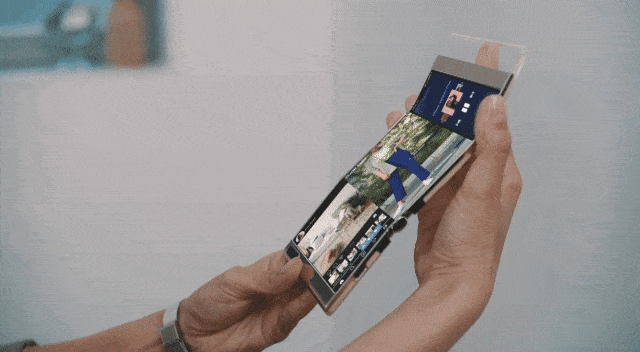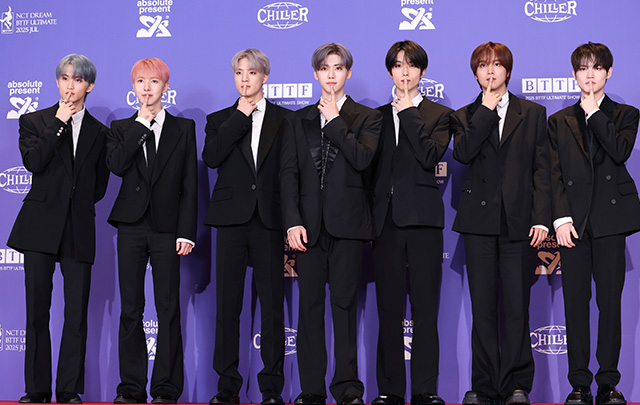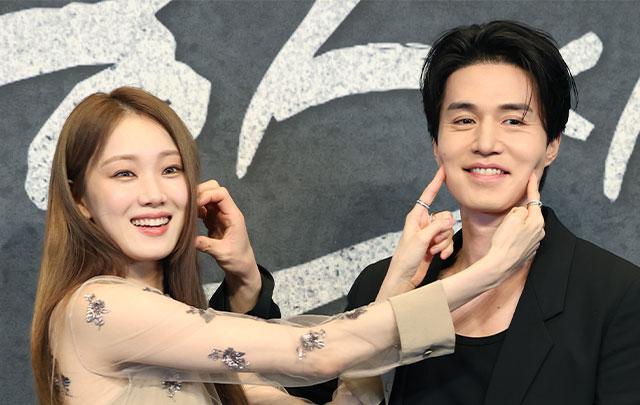그렇다면 우리는 천제나 환웅의 자손이라 해야 할 것 같은데 단군의 자손이라 한다. 아마도 웅녀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기 때문인가 보다. 결국 우리의 간접조상이 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곰은 인간이 되기 위해 쓰고 맵디매운 쑥과 마늘을 참아가며 먹은 측은함 때문인지, 이유는 불분명하나 우리들의 마음은 곰을 사랑하거나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편, 참을성 없었던 호랑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산신(山神) 대접을 하였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동물을 어느 정도 숭배한 셈이나 또 달리 숭배한 동물은 없는 것 같다.
서양사람들이 우리 땅에 처음 침투했을 때, 그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샤머니즘이나 미신에만 의존하는 미개인 내지는 야만인 수준으로 깔보았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미신이 없거나 인간 아닌 다른 동물을 숭배한 일이 없다는 말인가?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의 어느 민족도 그들 나름대로 숭배한 동물이 있고, 그 대상은 척추동물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각가지 야생동물도 숭배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흔히 곤충을 하찮은 벌레 따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이런 벌레까지 신으로 모셨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왕소똥구리였다.
약 3,700년 전의 이집트 유적 중, 투탕카멘(Pharaon Tutankhamen) 왕릉에는 왕소똥구리가 태양을 굴리는 것을 도안한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궁전의 천장에도 이 소똥구리가 그려져 있다.
소똥구리가 신으로 모셔졌던 이유
그들의 일상 생활도구나 옷가지에도 이 도안들이 있다. 대영박물관(大英博物館)의 미이라관에 소똥구리가 많이 진열된 이유를 알고 견학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어쨌든 이런 유물들은 그들이 얼마나 소똥구리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상은 한때 유럽의 북부지방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어떤 이유로 소똥구리를 신으로 모시며 숭배했을까? 적지 않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우주신(宇宙神)으로 믿었음을 들 수 있다. 하루 종일 해가 떠있는 동안 뒷다리로 둥근 공(소똥)을 굴리는 것은 창조를 위해 둥근 천체(天體)를 운행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태양이나 달의 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왕소똥구리는 머리 앞쪽에 6 개의 뾰족한 돌기들이 방사상으로 나있는데 이 모습을 햇빛이 퍼지는 모양으로 연상했을지 모른다. 이보다는 6 개의 다리가 각각 5 마디로 나뉘어 총 30 마디가 되는데 이를 양력의 한 달로 풀이한 것이다.
한편, 굴려간 소똥이 28일을 지나면 새 수컷이 태어나므로 이 기간을 음력의 한 달로 풀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를 지나 성충이 되는 기간은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 20일만에 자라는 수도 있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성충이 되었더라도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굳어있으면 장기간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결국, 28일이란 근거도 빈약하며, 암컷은 없고 수컷만 탄생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어미의 보호 없이 생존할 수 있다하여 독립(獨立) 또는 독생(獨生)의 신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왕소똥구리는 수컷이 없고 암컷만 존재하며, 이들은 소똥에서 자연발생 한다고 믿기도 했다.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조물주(造物主)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필자도 한동안 이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한 일이 있으나 그들의 짝짓기 행동은 보지 못했고, 이집트사람들 역시 그래서 나온 발상일 것 같다.
사실상, 곤충 중에는 수컷이 없고 암컷만 존재하는 종이 적지 않다. 진딧물의 경우는 가을에만 암수가 존재하고, 서로 짝을 맺은 후 산란하지만 여름에는 암컷 혼자서 수 세대의 자손을 생산한다. 혹벌이나 좀벌처럼 몇 세대를 걸쳐도 전혀 수컷이 없는 곤충도 적지 않다. 곤충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의 무척추동물에서는 상당히 여러 종이 그렇고, 척추동물인 개구리나 도마뱀 중에도 수컷 없는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동물들은 암컷 혼자서 생식하기 때문에 생물학에서는 이들이 처녀생식(處女生殖), 단성생식(單性生殖) 또는 단위생식(單爲生殖)을 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역할, 동물에게서 배워야
왕소똥구리에 대한 이집트사람들의 또 다른 시각도 있었다. 자손을 많이 낳는다고 다산신(多産神)으로 믿은 것이며, 자식을 원하는 부인들이 이들을 잡아먹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왕소똥구리는 알을 가장 적게 낳는 곤충 중 하나다.
또 다른 시각은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에 비유한 것이다. 둥글게 빚은 소똥을 항상 수컷이 앞에서 끌고, 암컷은 뒤에서 민다고 생각했다. 이런 행동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사회생활은 남자가 이끌고 여자는 뒤에서 바쳐주는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소똥구리 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암컷이 일을 한다. 수컷은 소똥 굴리기를 돕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암컷이 굴리고 있는 소똥 위에 올라타고 가다가 약탈자를 방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수컷 자신을 위한 것이지 암컷의 중노동을 돕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왕소똥구리 신은 미신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들의 사고도, 지식도 현대인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곤충의 현대 과학적 이름(학명)은 저들의 전통적 사고를 부여했다. 동물의 학명은 1758년에 린네(Carl von Linn )가 처음으로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왕소똥구리에게 스카라베우스 싸켈(Scarabaeus sacer)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속명(屬名)의 어원인 스카라브(Scarab)란 단어 자체가 신성한 소똥구리를 뜻하는데 종명(種名)까지 싸크르[sacre= sacred(영어), sacr e(불어): 신성한, 신에게 바친]라고 했다. 린네는 긴다리소똥구리도 스카라베우스 (Scarabaeus)속으로 분류했고, 종명은 쉐퍼(Schaeffer)씨를 기념한 스카라베우스 (Scarabaeus)였다. 이후, 많은 소똥구리가 신종으로 발견되자 스카라베우스 (Scarabaeus)속 중 일부는 새로운 속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긴다리소똥구리도 독립하였는데 새 속명은 시지푸스(Sisyphus)다. 시지푸스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성품 나쁜 왕의 이름이다. 너무나도 힘든 소똥 굴리기를 사후 지옥에 떨어져 돌을 들어올리느라 고생하는 왕에 비유한 것 같다.
성신여대 김 진 일 교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