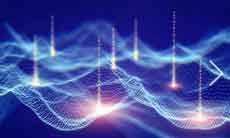올 상반기 미국 내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의 도매 처방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비만·당뇨 치료 수요가 확대되면서 GLP-1 계열의 치료제가 대세로 확실히 자리잡으며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효능과 접종 편의성을 강화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을 양분했으며, 기존 강자였던 ‘삭센다’는 판매가 급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같은 흐름을 타고 GLP-1 관련 신약과 신규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내 GLP-1 계열 약물 도매 처방액은 72억 7500만 달러(10조 1187억 원)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1.7% 급증했다. GLP-1 계열 약물은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인다. 기존 약물 대비 체중 감소 효과가 크고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 당뇨·비만 치료 분야에서 차세대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체별로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36억 7600만 달러(5조 1141억 원)로 전체 처방액의 절반 이상(50.5%)을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는 35억 4500만 달러(4조 9311억 원)로 지난해보다 152.8%나 급증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GLP-1 계열 전체 약물 처방액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비중이 99.3%에 달했다. 기존 GLP-1 계열 선두 제품이었던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 처방액은 1억 300만 달러(1432억 7300만 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66.4% 감소했다.
시장조사업체 이벨류에이트는 GLP-1 계열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해 2030년에는 글로벌 처방약 시장에서 9%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비만·당뇨 이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글로벌 빅파마들은 GLP-1 계열 물질의 적응증을 심혈관·뇌질환·수면장애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GLP-1 계열 약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128940)은 자사의 지속형 약물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GLP-1 수용체 작용제 ‘에페글레나타이드’로 국내 최초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 3상 막바지에 있으며 9월 임상 종료 후 연말에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약물은 기존 GLP-1 계열이 가진 근육량 감소나 위장관 부작용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설계가 강점으로 꼽힌다.
일동제약(249420)도 ‘ID110521156’이라는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올 6월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공개된 임상 1상 다회 투여시험 결과에 따르면 4주간 투약 시 저용량군은 평균 5.5%, 중용량군은 6.9%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GLP-1 계열에서 흔히 보고되는 위장 장애나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삼천당제약(000250)은 GLP-1을 작용기전으로 한 비만치료제 개량신약 'SCD0506'의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9월 당뇨병을 적응증으로 연구개발에 들어가 비임상 단계를 거쳤다.
디앤디파마텍(347850)은 GLP-1 수용체 작용제 'NLY01'를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로 개발하고 있다. NLY01은 GLP-1 제제인 엑세나타이드를 변형한 물질로,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 감소, 염증 감소, 신경 세포 성장 촉진 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평가한 임상 2상이 종료된 상태로,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GLP-1 계열 약물이 당뇨뿐 아니라 비만 치료 전반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장기지속형이나 경구형 등 다양한 제형으로 전환하고, 근육 감소나 구토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력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병용요법을 통해 GLP-1 성분을 비만 외 다른 질환 치료에도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yj@sedaily.com
syj@sedaily.com